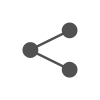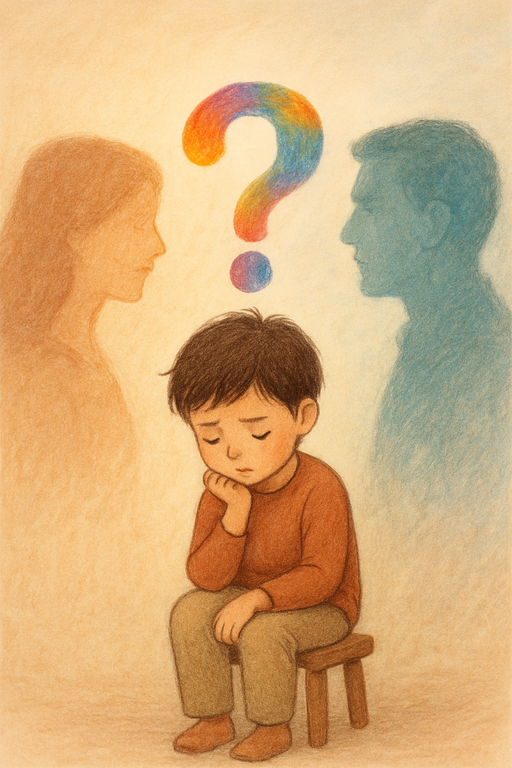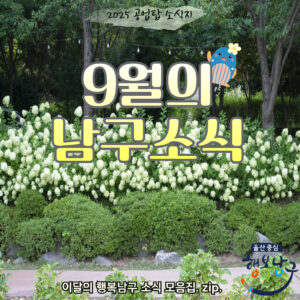|
|
공업탑 독자 김동석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맞닥뜨렸을 질문이다.
장난기 어린 이 한마디에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도를 금세 알아챘고, 능숙하게 그 함정을 피해 나갔다.
정직하게 한쪽을 택했다가 부모님 중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조심스러웠던 아이들,
내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의 순수함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 사회도 어느새 그렇게 단순한 이분법 속에 갇힌 듯하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고,
내 쪽은 절대 옳으며 상대는 절대 그르다고 믿는 편 가르기가 일상이 되었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 선’이라 여기며,
반대 의견은 ‘절대 악’으로 치부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세상에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님을, 어느 한쪽만 옳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한다.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의 유연성을 갉아먹고, 깊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진심 어린 대화와 타협 대신, 편 가르기로 상대를 배척하는 풍토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나의 결정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길이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부당한 전제를 내포한다.
사실은 ‘둘 다 좋아할 수도, 둘 다 싫어할 수도 있는’ 복잡한 마음을 간과한다.
또한 아이가 답해야만 하는 선택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싫어할 것이라는 암묵적 강요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멈추어야 할 때다.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점이 좋고, 아빠는 어떤 점이 좋아?”라며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물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다름을 인정하고, 복잡한 감정을 포용하는 사회. 그런 성숙한 우리를 나는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