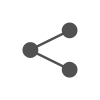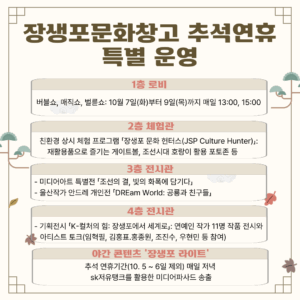|
|
공업탑 독자 김민영
이사를 할 때마다 늘 고민거리 하나가 따라붙었다. 무겁고 덩치 큰 영창 피아노였다. 성인이 된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에도, 비좁은 방 한편을 차지한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먼지는 쌓여가고 자잘한 물건을 얹어두는 선반처럼 사용한 지 꽤 되었다. 집 또한 좁아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 피아노는 고단한 내 삶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동시에, 소리 없이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 주던 버팀목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은은히 타오르던 내면의 등불이기도 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를 잃지 않게 해준 유일한 중심이었다.

피아노를 구매한 지 큰아이 나이로 따져보면 어느덧 30여 년이 되었다. 그때 나는 신혼살림을 산골짜기 외딴곳에서 시작했다.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그곳에 살고 있던 남편과 앞뒤 재지 않고 중매로 결혼을 결정했다. 서둘러 결혼한 것이 내 몫일 수 있지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시골 생활은 절대 만만치 않았다. 낯선 풍경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손에 익지 않은 텃밭과 농사일은 나를 자꾸만 작아지게 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남는 건 쓸쓸함뿐이었다. 이따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붙잡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려 할 즈음, 큰아이가 태어났다. 그 작고 따뜻한 존재는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어주었다.

마치 길을 잃은 삶에 첫 번째 이정표가 세워진 듯했다. 척박한 환경이 아이들의 가능성까지 가로막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피아노를 들였다. 얼마나 무모하고 철없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또 그렇게 하리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것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선택이다.
피아노는 소리가 좋아야 한다고 여겼다. 비록 중고지만, 이름 있는 회사의 악기를 떠올렸고 한 대를 골라냈다. 건반을 두드리자 낮고도 깊은 울림이 매장 안을 채웠다. 그 순간 아이들의 고사리손에서 피어날 노래를 상상했다. 외진 우리 집에 음악이 깃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집 입구부터 부딪쳤다. 설렘을 안고 실어 온 피아노는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방문이 작아서 문틀에 걸려버린 것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것을 뜯고서야 안으로 들일 수 있었다. 배달 기사님이나 남편에게 머쓱했지만, 그땐 그저 피아노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처음엔 아이들도 좋아했다. 건반을 눌러보며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작은 손으로 ‘도레미’를 찾아 누르던 순간,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 더 넓혀주었다는 위안을 얻었다.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아노는 아이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다. 교본은 자꾸만 같은 페이지에 머물렀고, 건반 위를 오가던 손끝에는 점점 귀찮음이 묻어났다. 숙제처럼 마지못해 앉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흥미를 붙여주고 싶어 애를 썼지만, 피아노는 점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십여 년을 살고 도시로 이사를 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기에 피아노를 소중히 다루어 옮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식들은 더 이상 피아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사를 할 때마다 ‘이번엔 버려야 할까?’ 망설였고, 그렇게 결정을 미룬 채 지금까지 곁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쉽게 피아노를 놓지 못했다. 그 안에는 내 욕심도, 후회도, 어쩌면 버리지 못한 꿈의 조각들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인 듯했다. 누구든 우리 집을 방문하면 피아노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그때마다 나는
“버리긴 해야 하는데···”

말꼬리를 흐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그것이 아닌 답을 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한 시절을 함께한 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젠 정말 버려야 할 나이가 되었다. 버리기 전에 한번 배워보자고 생각했다. 학원비가 만만찮았다. 손가락에 힘 있을 때까지 배우는 것인데 생활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망설여졌다. 그런 마음을 자식들에게 비추었더니 ‘복지관’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우리 집 가까이 복지관이 있어도 발 디디기가 쉽지 않아 매번 지나던 곳이었다. 핸드폰으로 복지관을 검색했다. 배너에 여러 가지 배움터가 떴고 그중에 피아노가 저렴한 가격에 올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자 묵은 숙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 당장 전화 걸어 등록했다. 이제야, 그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피아노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차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접어두었던 나의 꿈에 작은 숨을 불어넣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