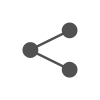|
|
공업탑 독자 김은경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을 좋아하던 중학생 딸이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우리도 예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안 돼요?”
” 나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냉정하게 잘랐다.
“털 날리고, 사룟값 들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우리 형편에 무리야.”
딸은 며칠간 조르다 체념한 듯 물러섰고,
나는 스스로의 결정이 옳다 타일렀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몇 달 뒤, 딸이 말했다. “이번 주말부터 유기견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려고요.”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평소 집안일도 꺼리던 아이가 똥을 치우고 사료를 나르며 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내 걱정은 기우였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딸의 얼굴엔 땀과 털이 묻었지만, 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이후 딸은 매주 보호소를 찾았고, 놀랍게도 공부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
책임감이 자라고 있었다.
강아지를 향한 사랑이 딸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돌보며, 딸은 자신도 몰랐던 단단함을 키워가고 있었다.
문득 돌아본다. 정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아이의 간절함을 너무 쉽게 눌러버린 건 아닐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다.
언젠가 딸이 다시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 키우자. 같이 사랑하며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