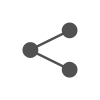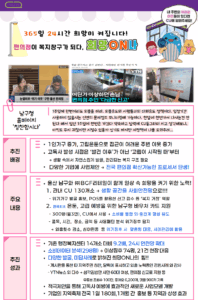|
|
공업탑 독자 김은경
지난주 둘째 딸이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해 올 것이라고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부부 모두 평소 개를 좋아하지 않아 집안에서 키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 한 일이다. 집안에 털이 날리는 것도, 똥오줌을 처리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 지불도 모두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2’ 둘째의 뜻을 거슬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마지못해 허락하기로 했다.
곧 입양될 유기견을 위한 준비물을 사러 인근 대형마트에 들렀다. 침대·침구, 밥그릇·물그릇, 하네스, 산책용 목줄, 배변용 패드, 장난감, 옷, 사료·간식···. 없는 게 없었다. 듣자 하니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예방주사나 계절별로 각종 접종을 하고, 간혹 미용실에서 외모 가꾸기도 빠질 수 없단다. 요즘 개 한 마리 키우려면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준비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둘째가 이제는 새 식구의 이름을 지어야 한단다. 아 참 그렇구나! 그래도 성의 없이 ‘개똥이’, ‘복실이’로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 가족들의 난상토론 끝에 검은 털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름을 “까미”로 결정했다.
집으로 오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Welcome to my house, KKAMI!” 플래카드를 현관 앞에 붙이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도 싫어하는 개가 곧 집에 온다는데, 은근히 내일이 기다려지는 내 모습이···. 그냥 피식 웃었다.